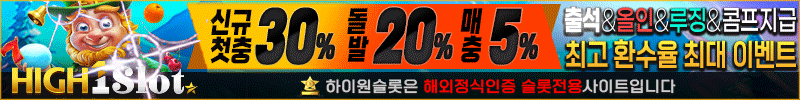미친년과 하룻밤을 (1부)
 avkim
0
1687
0
2021.03.02 13:03
avkim
0
1687
0
2021.03.02 13:03
삼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옷가지를 처덕 처덕 껴입고 있었다. 열 댓가지는 될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가려야할 보지와 똥구멍이 히끗 히끗 보인다. 보지털이 새까맣다 못해 번들거리는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마치 탄광속의 새까만 탄가루로 문질러 놓은 듯 했다. 엉덩이 짝이 드러날 때마다 씰룩거리는 두 뭉치 살덩이가 출렁거렸다. 지나는 사람들 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마치 못볼걸 잘못 본냥 실눈들을 하며 급히 피하여 지나가곤 한다. 가까이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다. 온갖 세상 잡스런 냄새는 홀로 다 짊어 지고 있기라도 한듯 잡탕스런 냄새였다. 얼굴을 자세히 뜯어 볼라치면 아직은 젊은 여자인 것 같았다. 코끝이 오f 솟은게 섹스러움도 약간 풍기는 듯 했다. 찌는 더위 속에서도 껴입은 옷가지들은 벗으려 하지 않았다. 해가 넘어 갈 무렵이었기에 조금은 더위가 한 풀 꺽이는 시간이었다.
미친년은 길가 가로수 밑에 철퍼덕 앉아 혓바닥을 개처럼 내어 놓구 헥헥 거린다. 두다리를 벌리고선 계속해서 뭔가를 찾는 듯 땅바닥을 두리번 거리며 찾는 시늉을 한다. 가랑이 사이로 드러난 보짓살이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앞가슴도 풀어 헤쳐진 가운데 젖퉁이가 드러나 좀은 축 쳐져 있는 듯 하였다. 보는이들로 하여금 킥킥거리는 웃음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광경이었다. 누구하나 감상하는데 짜릿함을 느끼기에 바쁜 나머지 은밀한 부위를 가려 주려 들지 않는다. 물론 가까이 가서 좋은 일을 하기위해서는 똥통에 빠진 진주반지 찾아 내는 일이나 똑 같은 고초를 겪어야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미친년은 땅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집어 들어 입속으로 가져간다. 어그적 어그적 씹는다. 그의 눈에는 먹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였나 보다. 잘 씹히지 아니하니까 뱉어 버린다. 나는 용기를 내었다.
영웅심리가 발동한 것 같기도 했었다. 가까이 다가가 만천하에 드러난 미친년의 보짓살을 널부러진 옷가지로 가려 주려했다. 한 발작 한 발작 내 딛어 가까이 다가 갈 수록 풍겨오는 냄새는 나의 오장육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것 같았다. 윽! 토할 것 같았다. 그래도 입, 코를 틀어 막고 용기있게 다가가 사타구니께로 손을 뻗어 옷가지를 잡는 순간, 미친년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나를 피하려는 듯 한 자세로 방어를 하는 것 같았다. 헉! 나는 엉겁결에 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우뚱 거리다가 미친년 쪽으로 엎으러지고 말았다. 순식간의 넘어짐은 미친년을 껴안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 손바닥은 미친년 젖무덤을 덥석 움켜 쥐어 버리고, 다른 한손은 헝크러진 머리카락에 엉켜버렸다. 나의 얼굴은 미친년 얼굴 바닥에다 키스를 해 버리고 말았다. 새카만 얼굴위에다 비비적 거리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미친년은 고개를 요리 조리 잡아 흔들면서 나의 얼굴과의 마찰을 피하려 하였다.
그럴때 마다 눈과 눈, 코끝과 코끝, 입술과 입술은 좌우로 흔들어 댈 때마다 마찰이 심하게 계속 되었다. 미친년은 두려움에서 피하려 버둥거렸다. 나는 미친년의 그런 행동에서 더렵혀질 것 같은 내 얼굴을 피하려 버둥거린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 수록 얼굴끼리의 비비적거림은 뒤죽 박죽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순간의 시간은 짧았었으나 나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 서로가 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지 않았다. 그럴 수록 서로에게 힘이 들었고, 더운날의 사고가 이젠 서로에게 더 많은 산소만이 필요해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