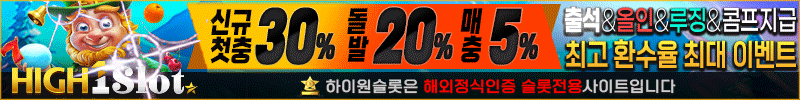침묵하는 손 (1부)
 avkim
0
1446
0
2021.03.02 13:19
avkim
0
1446
0
2021.03.02 13:19
1. 낯선 방문자(1) "띵동" "누구세요?" 혜미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갓 일어난 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 앞으로 나갔다. "여기 김한수씨 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물건 배달왔습니다. 도장갔고 나오세요" 혜미가 문에 난 작은 투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asla라고 쓰여진 모자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asla는 최근 TV를 통해 자주 광고되고 있는 택배 회사로 유럽과 미국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보낸다며 광고를 하곤 했다. 혜미가 잠시 어리둥절해 했지만 이내 안방으로 들어갔다. 가끔 혜미의 엄마가 밖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번엔 또 어떤 물건을 사신거지?" 혜미가 안방에 있는 장롱과 화장대 서랍을 뒤졌지만 여간해서 도장이 눈에 띄지 않았다. 혜미가 도장 찾기를 포기하고는 문쪽으로 달려갔다. "지금 도장이 없거든요? 혹시 제 도장은 안될까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딸인데요?" "그럼 본인 도장이라도 갖고 오세요" "네" 혜미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책상을 뒤적이더니 도장을 찾아냈다. 그리곤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문을 살짝 열었다. 안전장치를 해제 하지않아서인지 문은 사람 손만 겨우 빠져 나갈 정도였다. "여기 도장이요" 혜미가 도장을 내밀자 남자가 못마땅 한 듯이 혜미의 손에서 도장을 빼들고는 갖고온 종이에 도장을 찍고는 다시 건네줬다. "그럼 물건은 여기다 둘까요?" "어떤 건데요?" "29인치 텔레비전인데요?" 혜미가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커다란 상자가 문 앞에 있는게 보였다. 할수 없이 혜미가 문을 열었다. 남자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혜미를 보더니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썼다. "어디다 놀까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놓고 가야되요" 남자가 그렇게 채근하자 혜미가 문을 활짝 열고는 남자를 집으로 들여보냈다. 남자는 무거운 듯 낑낑대며 상자를 들더니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강남에 사는 초호화 아파트라 그런지 거실도 널찍하고 전망도 시원했다. 또한 넓직한 거실은 온통 비싸보이는 물건들로 여기 저기 장식되어 있었다. 혜미가 그런 남자에게 못마땅한 듯 말했다.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놓아주시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혜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상자를 그냥 바닥에 놓았다. 혜미가 그런 남자의 행동에 짜증을 냈다.
"그쪽 말고요 저 탁자에 놓으라니깐요?" 남자는 그런 혜미의 반응에 짜증이 나는지 손에 낀 목장갑을 다시금 추켜세우고는 혜미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그런 행동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인지 혜미가 주춤 주춤 뒤로 물러났다. "무.. 무슨 짓이에요. 가..가까이 오지 말아요... 소리칠 거예요" 남자는 혜미의 말에 픽하고 웃더니 눈을 부라리며 혜미에게 다가갔다. "소리? 그래 소리질러봐라. 듣자하니 이 아파트는 방음 하나는 끝내주던다던대?" "사...욱" 혜미가 뭐라고 고함을 칠려는 순간 남자의 손이 재빠르게 혜미의 복부를 강타했다. 혜미가 미처 말을 끝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욱" 혜미는 고통에 겨운지 채 말도 못하며 배를 잡고는 괴로워 했다. 남자는 그런 혜미에게 다가오더니 발로 혜미의 몸을 몇 번 찍어 눌렀다. "그래 비명을 질러보지 그래? 응? 비명질러봐" 혜미는 남자가 자신의 몸을 연신 발로 내려치자 몸을 웅크렸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좀전에 복부에 맞은 고통때문인지 높은 비명이 입에서 나오지 못했다. "꺄악...자.. 잘못했어요..엉엉" 남자는 연신 잘못했다며 울고 있는 혜미를 연신 발로 가리지 않고 찍어눌렀다.
"이런 쓰펄, 야 이 개년아 그래 니가 울고 있으면 내가 안조질 것 같아?" 남자가 입에서 욕지거리를 내 뱉으며 연신 혜미를 구타하자 혜미는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 혜미를 구타하자 남자가 구타를 멈추고는 혜미를 보고 짧게 말했다. "일어나" 혜미가 남자의 구타가 멈추자 서러운 듯 엉엉 울어댓다. 그리고는 주츰 주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쓰팔, 드럽게 말 안듣네, 이 썅" 남자가 주츰 주츰 일어나려는 혜미를 다시 발로 강타했다. 혜미의 옆구리를 강하게 강타하자 혜미는 일어나려던 자세 그래도 옆으로 뒹굴었다. "빨딱 안일어나?" 남자의 낮은 으르렁거림에 헤미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미의 얼굴은 온통 공포와 눈물로 법먹이 되어잇었다. "쓰벌 이년은 왜이리 둔해?" 혜미가 남자가 무서운지 남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마다 몸을 움찔 댔다. "저지요..." 혜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남자가 다시 눈을 부라렸다. "이런 쓰벌 뭐야?" "돈은 안방..." 남자가 주먹으로 혜미의 뺨을 강하게 쳤다. 헤미의 입에서 피가 배어나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개년아, 내가 말하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말도 하지마. 알았어? 빨딱 안일어나?"
남자가 그렇게 욱박지르듯이 말하자 혜미가 다시 얻어 맞는게 두려운 듯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다. 혜미의 얼굴이 남자의 주먹에 맞아서인지 눈물자국으로 얼룩진 왼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 올랐다. 그리고 입가에 조그맣게 핏물이 배어 있었다. 남자가 일어서는 혜미를 본체 만체 하면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있는 리모콘을 집어선 TV를 켰다. TV 화면이 켜지더니 위성방송이 흘러나왔다. 중국계 가수로 보이는 여자가 온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가수뒤의 배경이 빠르게 움직였다. 남자는 볼륨을 높였다. 순식간에 거실 전체를 울리듯 이름모를 중국가수의 노래가 거실에 퍼졌다. 남자가 혜미를 보고는 말했다. "옷 벗어" "예?" 혜미가 남자의 말에 어떨떨해 하자 남자가 들고 있던 리모콘을 혜미에게 집어 던졌다. 리모콘은 혜미의 얼굴에 맞고는 땅으로 굴렀다. "씨팔, 말안들려 옷 벗으란 말이다. 이 개년아" 남자가 다시 화나는 듯한 얼굴로 혜미를 노려보자 혜미의 얼굴이 다시 두려움에 질렸다. 혜미가 주춤 거리며 옷을 벗기 시작했다.
혜미가 입은 것은 별다른 옷이랄 것 까지도 없었다. 집안이 원낙 난방이 잘되어 잇어서 한겨울에도 반팔로만 생활해도 별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혜미는 짧은 티셔츠에 잘늘어나는 츄리닝과 그 밑에 속옷을 입은게 고작이었다. 혜미가 입고 잇던 티셔츠를 머리 위로 벗어 올리자 혜미의 아직은 덜 성숙한 가슴이 브래지어에 감춰진채 드러났다. 혜미가 웃옷을 벗고는 옆으로 떨구었다. 그리고 추리닝을 벗으려다 잠시 멈칫 하다가 입술을 깨물고는 천천히 추리닝을 벗었다. 그리고는 드러난 속옷 차림의 몸이 부끄러운지 팔로 가슴과 하복부쪽을 가렸다. "이리와" 남자의 말에 혜미가 두려워 하면서 주춤 주춤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혜미가 남자 앞에 서자 남자가 발로 혜미의 정강이 뼈를 세게 찾다. 혜미가 아품을 못이기고 몸을 굽히자 그런 혜미를 다시 발을 이용해 몸을 거세게 내리쳤다. 혜미가 다닥에 쓰러졌다. "쓰벌, 누굴 놀리냐? 엉? 내가 옷을 벗으랬지? 넌 아직 덜 맞은 거 같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혜미가 얼른 남자의 발을 잡았다. "잘못했어요. 벗을 께요. 용서해주세요" 혜미가 다시 울면서 남자의 발을 붙잡았지만 남자는 거칠게 혜미의 손에서 발을 빼서는 혜미의 몸을 발로 내려 찍기 시작했다. "꺄악, 잘못햇어요.. 아악.. 살려주세요.
엉엉" 혜미의 하얀 나신 여기 저기에 사내에게 맞은 멍자국이 찍혔다..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혜미를 한참동안 발로 내려찍던 사내가 잠시 구타를 멈추었다. "쓰벌, 좆도 못생긴게 말도 안들어요" 사내가 다시 소파에 앉고는 차갑게 말했다. "그만울어 쌍년아" 혜미가 눈에서 나오는 울음을 멈추고 딸꾹질을 했다. 하지만 사내가 무서운지 딸꾹질 소리도 곧 잦아들었다. "쓰벌, 앞으로 두 번 말하게 하지마. 알겠지?" 혜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의 눈에서 다시 불이 켜졌다. 그러자 혜미가 겁을 집어먹고는 금방 대답했다. "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는 다시 소파에 몸을 푹 기댔다. "옷벗어 쌍년아" 혜미가 아직 몸에 남아 있는 브래지어를 벗고는 팬티로 손이 갔다. 좀전에 주저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내의 매질이 무서운지 막바로 흘려 내려놓고는 발을 움직여 몸을 뺐다. 아직 덜 여믄 혜미의 몸이 사내의 눈에 들어왓다. 가슴은 이제 겨우 부풀기 시작했는지 몸에서 제법 튀어 나오기는 했지만 고작 작은 사발 하나 얹어놓은 듯 한손에 들어올 정도였고 밑의 음부는 이제 겨우 작은 거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지 보송 보송한 털들이 모습을 비치고 있었다. "앉아" 사내가 말하자 혜미가 냉큼 자리에 무릎꿇고 앉았다.